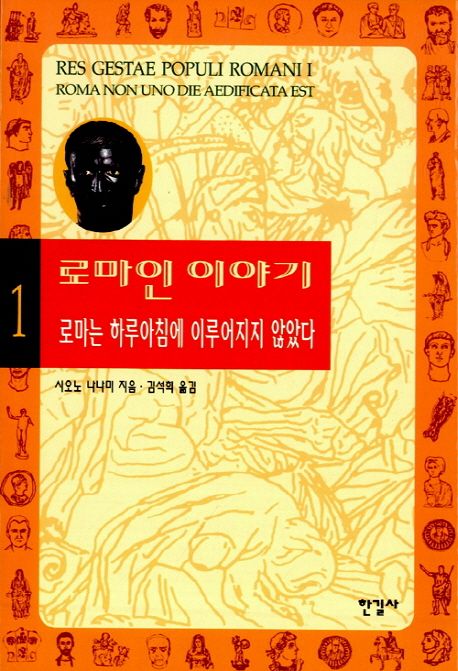로마인 이야기 제1권 -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 역사연구자들의 저서에 왠지 아쉬움을 느끼고 있던 나에게 마치 맨살에 착 휘감기는 비단옷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은 세 그리스인 폴리비우스, 플루타르코스, 디오니시오스의 역사관이었다. 왜 2천년 전에 살았던 이들의 로마관이 나에게는 더욱 휘감겨오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 로마가 융성한 원인을 정신적인 것에서 찾지 않은 태도다. 나 자신도 융성은 당사자들의 정신이 건전했기 때문이고, 쇠퇴는 정신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식의 논법을 납득할 수가 없다. 그보다 융성의 원인은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그들은 기독교의 윤리나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기독교 가치관을 통해 로마를 보아서는 기독교를 몰랐던 로마인을 이해할 수 없다.
셋째, 프랑스 혁명이 드높인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이념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념의 방해를 받지 않으니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그만큼 쉬워진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따위의 생각이 강해지면 그것과 이념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체제에 아무리 좋은 면이 있어도 이념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체제라는 이유만으로 그 좋은 면에는 눈을 감아 버리게 되는 법이다.
적잖은 사료가 보여주고 있듯이,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족(갈리아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까.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로마인이 이들 민족보다 뛰어난 점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방적인 성향이 아닐까. 로마인의 진정한 자기정체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개방성이 아닐까.
군사력이나 건설에서의 업적은 개방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상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전사의 군화 소리도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지고 빛나는 백악의 건축물도 폐허로 변해 버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먼 예산ㄹ의 로마를 동경과 경의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고대 로마인이 후세에 남긴 진정한 유산은 광대한 제국도 아니고, 2천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서 있는 유적도 아니며,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ㅇ리 다른 상대를 포용하여 자신에게 동화시켜 버린 그들의 개방성이 아닐까.
우리 현대인은 어떠한가. 그로부터 2천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종교적으로는 관용을 베풀 줄 모르고, 통치에 있어서는 능력보다 이념에 얽매이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을 배척하는 일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로마는 아득히 멀다'고 말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멀다는 뜻만은 아니다.